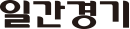[일간경기=홍정윤 기자]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일본이 진정한 양국 협력의 토대가 되는 역사 정의는 외면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일본이 군함도 세계유네스코 등재 당시 약속한 강제 징용 역사를 밝히지 않고 오히려 이를 감추는 패악을 자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2월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발언하고 “일제 강점기 시대의 역사정의 문제는 인권의 문제이자 주권의 문제다. 우리가 일본과의 역사 문제로 일본과의 안보나 경제협력을 소홀히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안보와 경제를 고려한다는 이유로 역사정의를 외면할 수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김용태 비대위원은 “(일본은) 자신들의 근대화 과정에서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한다”라며 일본의 강점기 당시 군함도를 짚었다..
김 비대위원은 “(군함도는) 지하 1000m 아래 경사진 좁은 곳에서 온도 40도가 넘고 바닷물이 떨어지는 탄광 속에서 채찍을 맞으며 중노동에 시달린 조선인들의 지옥같은 삶도 있었다”라며 “일본 정부가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23곳 중의 7곳이 조선인들이 강제 징용에 동원되었던 곳”이라 말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WHC)는 작년 7월 27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회의에서 일본 나가타현의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면서 ‘조선인 강제 노역을 포함하 전체 역사를 설명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그러나 일본은 강제 노역이라 표기하지 않고 ‘산업에 지원한 한반도 출신 노동자’라 명시해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았다. 이에 더해 지난해 11월 24일 일 니가타현 사도시에 열린 제1회 사도광산 추도식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인사를 대표로 보내는 오만함을 보였다. 결국 한국 측 유족은 불참했고 반쪽짜리 추도식으로 끝났다.
또 일본은 2015년 군함도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자, 강제 징용에 대한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 바꿨다.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은 사토 구니 주(駐)유네스코 일본대사의 ‘1940년대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against their will) 동원되어 가혹한 조건하에서 강제로 노역을 했다(forced to work)’라는 발언을 “강제노동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 것이다.
또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올해 1월 말 공개한 일본의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관련 후속 조치 보고서에 의하면, 대한민국이 요구한 군함도에 강제 징용 역사를 담은 게시물이 배치되지 않았고 도쿄 산업유산정보센터의 강제 동원 부정 자료 철거도 이뤄지지 않았다.
물론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는 한국 정부의 책임도 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2023년 9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회의에서 일본이 강제 징용 역사를 기록하지 않은 것에 대해 “추가 조치를 취했다”라며 관대한 입장으로 선회했을 때 정부는 이미 대응을 시작했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2023년 11월 말부터 2027년까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심사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학계에 의하면 2024년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회의에서 사도광산은 표결없이 등재되었다고 한다.
당시 대한민국이 반대했다면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불가했을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 김용태 비대위원은 “일본과의 역사정의 문제는 죽창가를 외치고 선동한다고 해서 진전되지 않듯이 일본의 선의에 대한 기대만으로 해결될 수도 없다”라고 단언했다.
아울러 김용태 비대위원은 “일본이라는 나라, 그리고 한일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경제 안보 협력과 역사정의 문제 해결을 병행하여 끈기있게 추진해 가야 한다”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