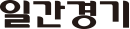가을단상
오희숙
가만히 하늘만 쳐다봐도 마음 편안한 계절이다. 뭉게구름 사이로 추억이 고개를 내밀고 있다.
시절마다 함께했던 사람들은 그 사연도 다양했다. 추억은 시간을 비켜갔는지 퇴색되지 않은 채 하나같이 푸르다.
하지만 인화되어 가는 사진처럼 추억이 선명해져도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이 아쉽기만 하다. 여름날 소나기처럼 짧았던 인연들은 그리움의 허기만 채운 채 묵은 추억을 덮고 있다.
가을은 그리움을 안겨주는 맞춤형 계절인가 보다.
잘 익어 벌어진 석류는 틀니를 하고 웃던 한 할머니를 닮았다. 할머니는 틀니 사이로 새어 나오는 웃음을 줄줄 흐르듯 보여줬다.
어릴 적 그 웃음소리에 따라 아이들 역시 환하게 웃곤 했다.
그 할머니는 힘들어도 슬퍼도 살다 보면 다 지나간다고 했다. 돌아보면 할머니의 웃음에는 슬픔과 깨달음이 함께 담겨 있었던 듯하다.
나의 텃밭에는 향기로운 들깨와 진초록의 배추·갓·시금치가 제 빛깔을 드러내고 있다.
나는 토실토실한 가을 햇살 아래에서 오달진 토란을 캔다.
“안녕하세요? 편지 왔습니다.”
우체부 아저씨의 반가운 목소리다. 드릴 것이 마땅치 않아 아쉽다. 단감나무라도 심어두었다면 따서 가방에 넣어 드릴 텐데, 고맙다는 인사만 한다.
인사를 마치기도 전에 빨간 오토바이는 저만치서 웽웽거린다.
나는 잠시 일손을 멈추고 조심스레 봉투를 뜯는다. 누가 볼까 싶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밀봉된 편지다.
꼭 붙은 밥풀은 형님의 마음처럼 단단하다.
토란잎으로 한 뼘의 초록 농사를 지었듯, 편지 봉투는 형님의 밥풀로 그리움의 농사를 지어놓고 있다.
밥풀의 흰빛을 따라가다 보면 형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형님은 밥은 먹고 지내냐며 다정하게 묻는 듯 봉투 위에 밥풀이 꼭 붙어 있다.
‘보고 싶은 동서에게!’
반듯한 자필에서 잊어가던 사별의 서러움이 울컥 밀려온다. 아픔은 가슴에 묻는다고 묻히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느낀다.
십수 년을 형님 곁에서 살다가 훌쩍 떨어져 지내니 형님의 마음이 놓이지 않는 모양이다.
시부모님이 계시지 않은 내게 큰형님은 어렵기도 했지만, 4남1녀 막내였던 나는 많은 사랑을 받았다.
시댁 없는 여자들이 얼마나 있을까.
형님들이 “막내 동서!”라고 단단히 불러줄 때마다 나는 참 좋았다. 나는 토실토실하게 “예, 형님!” 하고 대답하는 걸 좋아했다.
그렇게 서로를 끌어안으며 토실토실한 사랑을 알뿌리처럼 키워갔다.
아픔이 닥쳐와도 뿌리처럼 뻗어나가며 일어섰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토란처럼 단단해졌다.
‘막내 동서’라는 호칭은 내게 한 여성으로서의 소속감을 느끼게 했다.
시댁 형제들과의 술자리에서도 불편한 적이 없었다.
그 시절이 문득 그립다.
‘형님 저 왔어요’ 하고 알토란처럼 크게 외치며 형님 집에 들어설 날을 기대해 본다. 광주에서 서울까지는 멀지만 언젠가 그럴 날이 올 것이다.
어디서 날아왔을까. 앙증스러운 빨간 단풍잎 하나가 수북한 토란 위에 내려앉는다.
이토록 고운 빛을 어떻게 낼 수 있을까. 나는 어떤 빛을 닮아가야 할까.
나를 나타내는 빛깔이 있다면 무슨 색일까.
노란 은행잎은 아닌 것 같다. 둔탁하게 떨어지는 감잎일까, 아니면 거무죽죽한 토란의 빛깔일까.
그래도 토란 색이면 다행이다. 겨울 내내 먹어도 질리지 않는 그 색처럼.
토란과 호미 위에 형님의 손편지를 올려놓는다. 가을 풍경까지 한 아름 챙겨 들고 텃밭을 나온다.
시월의 햇살이 따사롭다. ‘막내 동서!’라고 부르던 형님의 목소리처럼.

오희숙 작가
치유문학상 동시 최우수상, 서울지하철 문학상 외 다수 수상, 광주문인협회, 한실 문예창작 회원 외 다수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