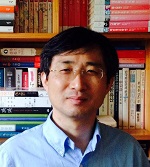
K대학에서 노어노문학을 전공했고, O광고대행사에 AE로 입사, 대한극장 맞은편 빌딩의 N기획에 스카웃되어 마케팅국장, 신사동에 S기획을 설립하여 오랜 동안 광고디자인 대행과 독특한 카렌다 개발에 전념...
N기획에 갓 입사한 내가 그를 직장 내의 라인으로 삼고 상사로 모시기 시작한 1990년 봄, 그는 주말 필드플레이에 대비해서인지 사무실 데스크 옆에서 드라이버 스윙 연습을 맨손으로 열심히 하고 있었다. 물론 OB를 내지 않기 위해서...안전하게 페어웨이에 안착시키기 위해서...솔직히는 휘황찬란한 광고주의 결재 싸인 옆에서 미래를 평탄하게 다지기 위해서…

물론 나는 그의 눈앞에 펼쳐진 페어웨이를 거부하고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간 티샷처럼 여의도에 치과를 차리게 되었고, 그에게 자질구레한 홍보제작물을 의뢰하는 미미한 광고주로서 제작비를 그분의 치과치료비로 상쇄(?)시키는 단골 주치의가 되어버렸다.
5년 전 그가 직장암 말기를 판명 받고 암환자이자 치과환자가 되어 우리 치과에 오셨을 때 난감했던 순간을 기억한다. 그는 병원에서 사형선고(?)를 받자마자 현대의학과의 인연을 완전히 끊고 ‘생식을 위주로 한 식이요법’에 ‘정상적인 경제활동’이라는 스스로 내린 처방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었다.
깡마른데다 병색이 완연한 모습으로 암과의 동거를 선언하던 순간의 비장함이 자신에겐 어떤 안락함을 주었을런지 모르지만, 당장 치과 치료를 해야하는 입장에서는 난감하기 이를데 없었다.
우선 현재 그의 전신적 상태를 알 수 없었다. 급성 치주질환으로 발치를 해야하는데, 암이 몸의 어느 장기에까지 옮겨갔는지 알 수 없으니 발치 후 합병증을 예측하기 어려웠다. 게다가 치과처방에 의한 복약 역시 임의로 중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고…
물론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최소한의 출혈이 동반되는 외과적 치료를 무사히 진행했고, 임플란트 수술은 엄두도 못 냈기 때문에 치아상실 부위는 무조건 과거 방식인 브릿지 보철물로 조심스레 해결했다.
특히 가장 난처하게 했던 점은, 그의 구강 질환이 대부분 경계징후(Border Sign)에 걸쳐 있어서 가령 이를 뽑기도 그렇고 안 뽑기도 그런 애매한 상태에서 늘 고통스러워 하셨다는 것이다. 병기(病期)를 보더라도 적극적인 치료를 하기에는 너무 늦지 않았는가 하는 비관적 예측이 내 판단을 흔들었다. 심지어 '인간에게 이렇듯 취약한 장기인 치아를 갖게한 것이 신이 인간에게 내린 천형(天刑)이 아닐까?'라는 근원적 고민과 더불어서...
현실적인 관점에서는 더 안타까웠다.
안구가 함몰되고 광대뼈만이 툭 튀어나와서 죽음의 그림자가 잔뜩 드리운, 보기에 안쓰러운 외모를 무릅쓰고 힘겹게 힘겹게 영업활동을 하시면서 두 아들 대학 학비 마련에 동분서주하시는 걸 보노라면, 얼마나 더 사실지도 모르는데, 그 따위 치과치료비를 청구할 마음도 내키지 않았고, 하더라도 도대체 얼마를 내라고 말씀드려야 하는 건지...
얼마전에 그분 장남의 이름으로 부고(訃告) 문자를 받았다.

모교 대학병원 빈소에서 검은 양복을 입고 문상객을 맞는 늠름한 두 아들을 보며 나는 그분의 고뇌에 찬 처방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자식의 대학졸업과 취직을 위해 임종 직전까지도 현실을 붙들고 놓지 않았던 아버지의 뼈만 앙상한 손...기꺼이 가족의 디딤돌이 되어 차갑게 굳어버린 아버지의 영혼이 그들 머리 위에 어리는 듯 했다.
“차 원장, 이제 난 더 이상 치과 갈 일 없네. 나 때문에...고생 많았지?”

